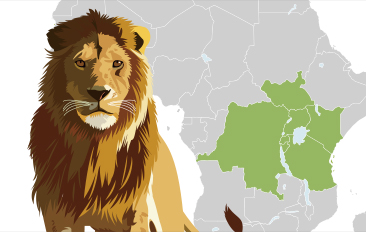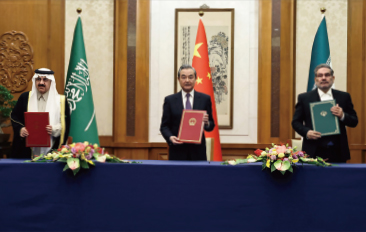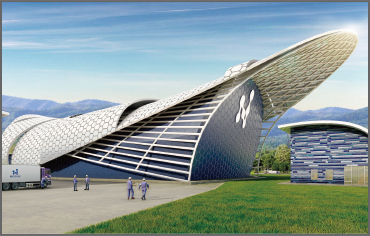라이프
시장 없는 자급자족 경제


로마제국 멸망 후 동방과의 교역선이 끊긴 유럽은 촌락 중심의 자급자족 경제로 재편되면서 농민의 삶은 촌락에 묶이게 됐으며 농민들은 대장장이, 목수 등 장인의 역할까지 했다. (다비트 테니르스(II) 作, 캔버스에 유화)
강대했던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을 유럽의 고대와 중세의 분기점으로 본다. 로마제국이 번성하던 시기에 갈리아에서는 마르세유 등의 무역항을 통해 콘스탄티노플·이집트·에스파냐·이탈리아 등지에서 수입한 파피루스와 향료, 고급직물, 포도주, 올리브유 등 동방의 생산품이 거래됐다. 하지만 시리아나 동방에서 갈리아 지역으로 수입되던 상품들은 8세기경에 이르면 수입로가 거의 완전히 막힌다.
수출할 물건도 거의 없었다. 극소수 남은 무역선을 통해 동방에 내놓을 만한 것은 노예 정도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도 지속해서 공급하기가 쉽지 않았고 수지타산도 맞지 않았다. 당연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교역이 끊기면서 사라진 것들
자연스럽게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품부터 사라져갔다. 가장 먼저 파피루스가 없어졌다. 서유럽 지역에서 파피루스에 쓴 작품들은 대부분 6~7세기 이전의 것이다.
향신료에 대한 언급도 이 시대 사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입맛은 ‘강제로’ 단순해졌다. 지중해에서 상업이 재개된 12세기가 돼서야 향신료는 서유럽 지역에 다시 등장한다.
가자 지방의 특산이던 와인 수입도 끊겼고, 오일도 더는 아프리카에서 수입되지 않았다. 결국 이 시대 이후부터 교회에선 기름을 사용하는 등잔불이 아니라 양초를 이용해 불을 밝히게 됐다. 실크도 더는 구경할 수 없게 되면서 샤를마뉴 대제 같은 유럽의 최고위층까지도 소박한 옷을 입었다고 전해진다.
이 시대에는 심지어 부의 상징인 금의 공급마저 감소했다. 해상 교역이 쇠퇴하면서 직업 상인이 사라졌다. 상품과 사치품은 상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쟁이나 약탈에 의해서 유통되거나 선물 형태로 교환됐다.
상인들의 원거리 무역은 감시 속에서 쇠퇴
중세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서유럽 주요 지역은 촌락 중심 경제로 재편됐고 경제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농민의 삶은 촌락에 묶였다. 로마제국 시대의 교환경제는 폐쇄적인 소비경제로 대체됐다. 9세기에 이르면 서유럽 지역은 ‘폐쇄적 가내 경제’ 혹은 ‘시장 없는 경제’의 황금기로 평가되기도 한다. 농민들이 촌락 바깥 세계와 접촉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의식주의 대부분이 촌락 내부에서 해결됐다. 자연스럽게 농민의 의식주는 매우 소박해서 진흙 벽에 초가지붕을 얹은 오두막이 주택의 대부분이었다. 중세시대 사료에서 ‘메르카토레스(mercatores)’나 ‘네고시아토레스(negociatores)’로 불린 상인들의 특별한 활동인 원거리 무역을 감시하는 일은 각 지역 통치자의 책임이 됐다. 상인들은 많은 지역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신변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다. 카롤링거 왕조는 여행자들에 대해선 식량과 사료 판매를 제외한 모든 밤에 이뤄지는 상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고대세계에서 그토록 번성하던 경제는, 교역의 끈이 끊기면서 어두운 퇴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르네상스 시기 유럽인들은 ‘중세’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대기시간 같은 ‘중간 시기’, ‘낀 시대’라는 경멸적 의미에서 중세를 ‘메디아 아이타스(media aetas)’, ‘메디움 아이붐(medium aevum)’이라고 불렀다. 중세인들로선 억울할 법한 규정이지만 사실 초창기 중세 경제의 모습은 후대인들에게 크게 내세울 게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경제적 측면만 보자면 ‘암흑 시대’로 불릴 법한 면이 없지 않았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로마 멸망 후 유럽 경제의 쇠락은 그렇게나 빨리 진행됐다.

814년에 샤를마뉴가 죽은 지 불과 몇 세대 후에 그가 그토록 힘들여 통합시킨 대제국은 수라장이 되고 말 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