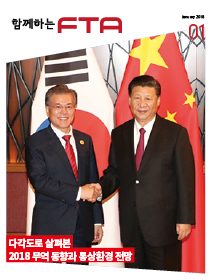PC/Tablet용 헤더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멀지만 친근한 나라
칠레 산티아고&발파라이소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칠레. 길게 뻗은 땅엔 사막부터 빙하까지 세상 모든 풍경이 펼쳐져 있다. 또한 스페인 식민지 시대를 겪은 도시들은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 있어 고풍스러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칠레가 FTA를 발효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고, 지난 4월에는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칠레 대통령이 방한해 물리적인 거리에 비해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이기도 하다. 수도 산티아고와 그 주변 도시를 여행하며 낯설면서도 친근한 칠레의 매력에 빠졌다.
글 박산하(blog.naver.com/haveagoodtrip)
아르마스 광장
칠레 경제 개관(2017년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국내총생산: 2,770억 7,594만 4,401.9달러, 세계 42위
•경제성장률: 1.49%, 세계 153위
•1인당 국내총생산: 1만 5,346.45달러, 세계 47위
•남미 내 경제 순위: 2위(2017년 크레디트 스위스 기준)
12월의 혁명, 예술이 되다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긴 나라야.” 다섯 살 조카에게 쓰는 엽서의 첫 문장이었다. 길이 약 4,329km에 달하는, 남미의 남서쪽 태평양 연안에 길게 뻗은 칠레 지도도 함께 그려 넣었다. 북쪽에는 사막, 남쪽에는 빙하가 있어 자연의 무궁무진한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나라. 어린 조카에게 칠레는 아마도 가장 친근한 나라로 기억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와 칠레는 2003년 FTA를 체결한 후 15년 동안 교역량이 4배 증가했으며, 지난 4월 양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이후 한층 더 가까워졌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 방한한 중남미 정상이기도 하다.
남미 여행의 첫 나라인 아르헨티나에서 칠레로 넘어오면서 가장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냈다.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먹다 남은 포도 한 송이가 좌석 앞주머니에 있었고, 출입국 심사 때 걸린 것이다. 농산물에 특히 민감한 나라에서 긴장하지 않아 저지른 실수 탓에 벌금 약 200달러를 내야 했다.
울적한 기분을 떨쳐내고 칠레 푸콘(Pucón)이란 도시에 다다랐다. 도착하기 2주 전에 용암이 분출해 연기가 풀풀 나는 비야리카(Villarrica) 화산을 눈앞에서 보니 두렵기보다 신기했다. 이곳에서 푸석푸석한 화산재를 밟으며 극기 훈련과도 같은 트레킹을 했고, 따끈따끈한 검은 모래사장을 품고 있는 맑은 호숫가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그리고 푸콘에서 북쪽으로 약 700km 떨어진 수도 산티아고로 향했다. 산티아고는 지중해성 기후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스모그 현상이 심해 아침이면 뿌연 하늘이 드리워질 때가 많다.
산티아고는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닌 도시이기도 하다. 1973년 9월 11일, 산티아고 라디오에선 “오늘 산티아고에 비가 내립니다”라는 국영 방송이 흘러나왔다. 분명, 맑은 날이었다. 이는 군부가 보낸 쿠데타 신호였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피노체트 장군은 문민정치를 부르짖던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신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린다. 아예덴은 세계 최초로 국민의 손에 뽑힌 사회주의 정권이었다. 그는 쿠데타군에 맞서 싸우다가 죽음에 이르렀고, 쿠데타로 인해 많은 시민이 무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현재 산티아고는 칠레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늘 활기가 넘치는 대도시이자 기후가 좋고 풍경이 아름다워 여행자도 많다.
스페인의 흔적이 남아 있는 산티아고
산티아고는 16세기 스페인의 페드로 데 발디비아(Pedro de Valdivia)가 건설한 도시다. 이후 400년 동안 스페인풍 건축물이 차례차례 세워졌으며, 산티아고 구시가지 중심엔 스페인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아르마스 광장(Plaza de Armas)이 자리한다. 이곳에선 분수와 대성당, 우체국, 시청 등 고풍스러운 건물 사이 휴식을 즐기는 산티아고 시민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여행자는 늘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특히 카메라를 비롯해 고가의 물건을 든 관광객은 소매치기범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사진을 찍자, 현지인이 다가와 카메라를 가방 안에 넣으라고 몇 번이나 주의를 줬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산티아고를 정복한 페드로 데 발디비아 기마상이 자리한다. 그는 1541년 산티아고 건설을 시작으로 발파라이소, 아라우카 등을 정복하고 칠레의 총독으로 군림했다. 그 후 1553년 원주민의 반란으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반대편엔 원주민 마푸체(Mapuche)족의 지도자 석상이 서있다. 아르마스 광장에서 가장 고풍스러운 건물을 꼽으라면 단연 대성당이다. 칠레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진 성당으로, 가톨릭교도가 인구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주말이면 많은 사람이 미사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남미의 성당에는 십자가 걸린 예수가 아닌 화려한 예복을 입은 마리아상이 걸려 있는데, 이곳 역시 혼재된 종교 문화를 느낄 수 있다.
아르마스 광장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중앙시장과 베가 시장에 갈 수 있다. 어디든 바다와 인접해 있는 나라답게 해산물이 풍부하다. 특히 신선하고 저렴한 전복은 꼭 맛봐야 한다. 시장 안에는 깔끔한 해산물 레스토랑도 자리해 여유롭게 식사도 할 수 있다. 각종 과일과 채소도 우리나라의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대도시
산티아고의 도시 전경을 보기 위해 산크리스토발 언덕으로 향한다. 우리나라의 남산과 비슷한 나지막한 산이다. 산바람을 맞으며 곤돌라를 타고 꼭대기에 오른다.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선 화려한 도시가 저 멀리 설산에 둘러싸여 있어 포근해 보인다. 정상에는 스페인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세운 마리아상이 있다. 높이 18m에 무게가 36.6톤에 달하는 거대한 마리아상은 팔을 벌린 채 자애롭게 산티아고를 내려다보고 있다.
산타루시아(Santa Lucía) 언덕도 빼놓을 수 없다. 스페인 정복자 페드로 데 발디비아(Pedro de Valdivia)가 원주민으로부터 저항하기 위해 만든 요새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던 곳이다. 이제는 칠레 시민들의 사랑받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아 평일에도 벤치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빈다. 산티아고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이기도 하다. 70m에 이르는 작은 언덕으로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산티아고의 시내가 한눈에 펼쳐진다.
식사를 하기 위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하다는 파리스 론드레스(Barrio Paris-Londres) 구역을 찾았다. 우리나라의 가로수길보다 덜 붐비지만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거리다. 식민지 시대에 들어선 유럽풍 건물들이 마치 세트장을 연출해놓은 듯해 촬영 명소로도 유명하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 곳곳에 있어 저녁이면 더욱 로맨틱해진다.
콜로니얼풍 대통령 관저인 모네다 궁전도 빼놓으면 섭섭하다. 모네다(Moneda)는 스페인어로 ‘돈’을 의미하는데, 원래는 조폐국 건물로 사용하다 1846년부터 대통령의 직무 공간으로 바뀌었다. 피노체프 쿠데타 당시 살바도르 아옌테 대통령이 끝까지 남아서 저항한 곳이라는 비극적인 역사를 품고 있다. 폭격을 당한 후 복원돼 현재는 위풍당당한 자태를 뽐낸다. 경비병들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어 가까이 접근할 수는 없지만, 이틀에 한 번씩 근위병 교대식도 열린다.
컬러풀한 매력의 항구도시, 발파라이소
산티아고에서 버스로 2시간여 떨어져 있는 칠레의 대표 항인 발파라이소(Valparaíso)로 향했다. 부산 감천벽화마을이나 통영 동피랑이 연상되는 아기자기한 벽화 마을이다. 마을 전체가 2003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옛 정취를 잘 간직하고 있어 여행자에게 인기다. 발파라이소는 1536년 스페인인 디에고 데 알마그로(Diego de Almagro) 일행이 발견해 ‘천국의 계곡’이라는 의미로 이름 지었으며, 1991년에 칠레 의회가 이곳으로 이전되기도 했다. 발파라이소의 옛 정취가 느껴지는 엘리베이터인 아센소르(Asensor)는 언덕 마을의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마을 꼭대기로 올라가 배가 촘촘한 항구를 내려다보며 다양한 색으로 물든 마을을 걷다 보니 자연스레 칠레란 나라가 조금 더 친근해졌다.

[VOL.85] 2019년 6월호 사이트맵 x
- 최초 FTA에서 최근 FTA까지
- FTA 15주년 회고와 평가
- FTA, 향후 과제와 방향
- 통상 전문 인력 양성, 이제 국가적 과제 돼야
- “수출 위험과 불확실성을 뒷받침하는 수출 경쟁력의 원천으로”
- 원두 생산 없이도 커피 그 이상을 수출하다
- 수출을 희망하는 귀농인, FTA 활용하려면?
- 수출 Boom-up 방방곡곡 지원단
- 무역 기술 장벽(TBT)
- 한류와 함께 성장하는 K-Fashion
- 멀지만 친근한 나라, 칠레 산티아고&발파라이소
- 조선에서 온 카펫, 조선철
- G20 정상회의
-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 무역, 통상 분야의 6~7월 일정을 소개합니다.
- 제1회 통상 플러스(+) 포럼
- 2019년 6월 무역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