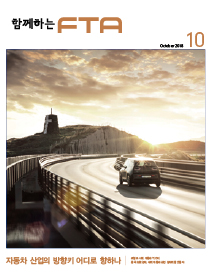PC/Tablet용 헤더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찬란한 마야문명이 깃든
미지의 국가, 온두라스
한국인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낯선 땅. 에메랄드빛 카리브해를 품고 국토 곳곳에 마야문명의 숨결을 고이 간직한 나라 온두라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위험을 무릅쓰기에 충분했다.
찬란한 마야문명의 유적지가 남아 있는 신비의 나라 온두라스에 자전거 바큇자국을 남긴 것이다.
글 김민형 blog.naver.com/alsgud0404
온두라스 경제 현황 (2818 온두라스중앙은행/IMF)
•인구 956만8,688명(세계 93위)
•GDP 약 230억 달러(세계 103위)
•국내총생산 231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 2,608달러
•경제성장률 3.7%
•수출 42억3,400만 달러 (커피, 바나나, 새우, 아연 등)
•수입 104억 달러 (기계류, 화학제품, 식품류 등)
광활하게 펼쳐진 황금빛 들판을 만나다
캐나다에서 시작된 자전거 여행은 어느새 계절을 세 번이나 바꿔놓았다. 엘살바도르를 지나 온두라스를 향해 페달을 밟던 날. 국경에서 이민국을 그냥 지나쳐버렸다. 건물이 너무 낡아서 국가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허름함. 온두라스를 대면했을 때 맨 처음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다. 여권에 도장을 받고 이민국을 나오니 슈퍼마리오 같은 수염을 한 아저씨가 나에게 환전을 요구했다. 1달러 22렘피라에 돈을 교환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환율이 1달러에 24렘피라란다. 온두라스에 입국하자마자 가벼운 환율 사기를 당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눈앞에 광활하게 펼쳐진 황금빛 들판은 나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1502년 콜럼버스는 미지의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 그 땅을 ‘카리브 연안의 깊은 물’이라는 뜻으로 ‘온두라스(Honduras)’라고 칭한다.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온두라스는 서쪽으로 과테말라, 남서쪽으로 엘살바도르, 남동쪽으로 니카라과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인구 구성은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티소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사용하는 언어는 스페인어다. 중앙아메리카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16세기 스페인의 침략으로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의 정서가 뿌리에서부터 혼탁하게 물들어버렸다. 타 민족에게 정복당한 안타까운 역사를 혹자는 문화의 융합이라 말할 것이고, 또 다른 이는 문화의 단절이라 하리라.
마야인의 정취가 남아 있는 촐루테카
너른 마당을 가진 현지인은 넓은 아량으로 간밤에 캠핑을 허락했다. 이튿날 자전거에 짐을 챙겨서 다시 길 위로. 자유를 느끼며 온두라스를 달린다. 8시간쯤 지났을까. 두 바퀴는 촐루테카(Choluteca)에 닿았다. 온두라스의 젖줄, 길이 350km의 촐루테카강이 흘러서 자연스레 형성된 마을 촐루테카. 예로부터 강은 지리적으로 행정구역을 가르는 중요한 좌표이자 원주민의 삶의 중심지였다. 기원전 600년부터 과테말라, 멕시코, 온두라스에 뿌리를 둔 마야문명 또한 이런 자연의 혜택을 받으며 전성기를 누렸다.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신정정치를 실시한 마야인은 최초로 ‘0’의 개념을 발견하고 천문학적 지식을 배양했다. 1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흔적은 온두라스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마을 중앙에 들어서자 고딕 양식의 대성당에 많은 인파가 모여 있다. 트럭에 열대과일 파파야와 파인애플을 쌓아놓고 시식을 권하는 상인, 라틴음악을 안주 삼아 맥주를 마시는 젊은이들, 비둘기를 쫓으며 광장을 누비는 아이들, 그리고 광장 구석에 장총을 어깨에 둘러메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군인이 눈에 들어왔다. ‘살인율 세계 2위’라는 악명은 눈앞에 마주한 평화 앞에서 누그러든다.
중앙 광장을 벗어나면 현지 식당, 호텔, 쇼핑몰이 즐비하다. 연인의 손을 잡고 데이트를 만끽하는 현지인으로 가득한 곳. 달달한 분위기를 틈타 “올라(안녕)”라고 인사를 건네자 커플들은 낯선 동양인을 반갑게 맞아준다. 그들의 부드러운 미소는 마음을 열고 다가간 여행자에게만 돌아오는 덤이다.
축구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나라
해 질 녘까지 자전거를 탔다. 고개를 들어 지평선을 바라보면 황폐한 사막 위에 민가가 듬성듬성 보인다. 가죽이 벗겨진 낡은 공 하나를 두고 마을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가며 축구를 하는 모습에 온두라스 축구와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떠오른다. 중남미의 살인적인 축구 열기는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살인적인’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경기 패배가 곧 선수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온두라스는 그 화제의 중심이 되는 나라다.
1969년 멕시코 월드컵 중앙아메리카 지역 예선에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격돌했다. 접경 국가로서 오랜 시간 영토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오던 두 나라. 역사적인 적대 감정은 축구 경기장까지 옮겨졌다. 1969년 6월 6일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Tegucigalpa)에서 열린 예선 1차전 경기에서 온두라스는 엘살바도르에 1 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경기가 끝난 후 엘살바도르 선수 측은 지난밤 숙소에 온두라스 응원단이 밤새 소란을 피우는 통에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매스컴을 통해 엘살바도르의 패배 소식을 전해 들은 한 소녀가 권총 자살을 하면서 온두라스를 향한 엘살바도르의 적대감은 고조된다. 예선 2차전 경기는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열렸다. 결과는 3 대 0으로 엘살바도르의 승(勝). 그런데 이날 원정 경기를 보러 온 온두라스인 두 명이 엘살바도르 관중에게 맞아 죽었다는 소문과 함께 온두라스 선수단 식사에서 설사약이 섞여 나왔다는 유언비어가 퍼진다. 분노가 극에 달한 온두라스에서는 엘살바도르인을 향한 무차별 테러, 약탈, 방화, 살인 행위가 시작됐고 두 나라는 단교를 선언한다.
국가의 연을 끊더라고 월드컵은 중요한 것이었기에, 양국은 멕시코에서 열린 예선 3차전에 참가한다. 그 결과 엘살바도르의 3 대 2 승리. 연장 12분 엘살바도르의 로드리게스가 터뜨린 결승골은 두 국가 간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한 온두라스의 원한은 엘살바도르를 향한 증오로 번졌고 테러는 점차 심화됐다. 이에 엘살바도르는 온두라스에 전쟁을 선포하고 폭격을 시작했다. ‘100시간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두 나라의 전쟁은 4일간 1만7,000여 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모든 것은 적당함을 넘으면 독이 된다. 축구에 대한 과한 열정이 자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테구시갈파의 현재
온두라스에서는 대다수 집이 산에 있다. 국토의 80% 이상이 산지기 때문이다. 해발 1,000m에 자리한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의 인구는 100만 명 이상이 넘는다. 현지 사투리로 ‘은의 언덕’을 뜻하는 테구시갈파는 16세기 금과 은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리고 스페인의 억압과 착취가 시작됐다. 오늘날 온두라스의 화폐에 등장하는 지도자 렘피라(Lempira)를 필두로 3만 명의 원주민이 스페인에 대항했다. 하지만 그가 살해당한 후 원주민들은 광산이나 농장에서 노예 취급을 당하게 된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설움이 있는 한국인으로서 핍박당한 온두라스 원주민의 아픔에 공감이 간다.
슬픔의 역사를 거름 삼아 지금은 전 세계에서 스페인의 유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매년 거리 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미술전과 음악회가 개최되고, 국내외 각종 금융업의 중심지로서 중앙아메리카 경제통합은행 본부 및 국제적 금융기관이 자리한 곳. 아직 하늘길이 열리지 않아 제3국을 경유해야 갈 수 있는 먼 나라지만, 언젠가는 자전거와 짐을 두고 가벼운 배낭을 메고 천천히 둘러보고 싶다. 그때는 이렇게 말하겠지. “무초구스토 온두라스(반가워요 온두라스).”

[VOL.89] 2019년 10월호 사이트맵 x
- 가마우지 벗어나 펠리컨으로, 소재·부품·장비 육성해 산업 체질 개선한다
- 시험대 오른 ‘수출 한국’이 나아갈 길, 포트폴리오 다변화·고도화·차별화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선도자 우위를 점해야
- 세계 시장으로 뜨는 신남방, 한국형 가치사슬 구축 시급
- “ 4대 수출통제체제 안건 상정·합의 세계 1위 전략물자 관리 위상 드높여 무역 진흥 앞장설 것”
- 1분이면 치아구조 확인하는 치과용 3D 스캐너의 활약
- WTO 반덤핑 협정
-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사전 대비
- 막막하기만 한 온라인 수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 전통문화, 한류의 새 길을 제시하다
- 찬란한 마야문명이 깃든 미지의 국가, 온두라스
- 백제, 아스카문화의 원동력이 되다
- 아시아 국가 최초, 중미 5개국과 FTA 발효
-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 무역, 통상 분야의 10~11월 일정을 소개합니다.
- 글로벌 통상환경의 지각변동 중앙·지방정부의 공유와 협력으로 대응
- 2019년 10월 무역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