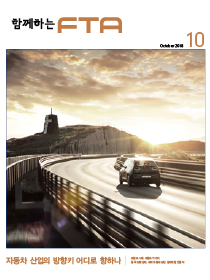PC/Tablet용 헤더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시베리아에도 꽃은 피었습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
어감마저 차가운 ‘시베리아’라는 이름을 듣고 누군가는 왜 그 추운 땅에 가느냐고 했고, 또 누군가는 TV에서나 본 곳이라고 했다. 그 땅의 중앙에 이르쿠츠크(Irkutsk)가 있다. 쉽사리 익숙해지지 않는 이국의 발음을 되뇌는 동안 비행기에서는 드디어 거대한 땅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르쿠츠크 전경
러시아 경제 개관(2017년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국내총생산: 1조 5,775억 2,414만 5,963.2달러, 세계 11위
•국민총소득: 1조 5,380억 509만 5,962.1달러, 세계 11위
•경제성장률: 1.55%, 세계 151위
•1인당 국내총생산: 1만 743.1달러, 세계 55위
12월의 혁명, 예술이 되다
흔히 이르쿠츠크를 가리켜 ‘시베리아의 파리’라고 한다. 이르쿠츠크가 수천km나 떨어져 있는 도시의 이름을 별명으로 갖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선 약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814년, 러시아제국의 알렉산드르 1세는 나폴레옹에게 승리하고 파리를 점령한다. 예술과 자유로 가득한 파리의 모습은 러시아 청년 장교들에게 꽤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전제정치로 고통받는 척박한 조국을 떠올렸고, 개혁을 꿈꾸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825년 겨울, 모스크바에서 이들 청년 장교가 중심이 된 반란이 일어났다. 일명 ‘데카브리스트(dekabrist)의 난’이다. 반란은 곧바로 진압됐다. 러시아어로 ‘데카브리’라고 하는 그 혹독한 12월에 주동자들은 바로 시베리아 유배형에 처해졌다. 이르쿠츠크가 바로 그 유배지 중 하나다.
이르쿠츠크에 도착한 주동자와 그의 식솔들은 어찌 됐든 귀족의 삶을 이어갔다. 잠깐이라도 맨살을 내놓으면 깨져버릴 듯한 무서운 추위에도 그들은 자신들만의 귀족 사회를 이르쿠츠크에서도 영위했다. 그 영향은 아직도 이르쿠츠크 길거리 곳곳에 남아 있다. 19세기 유럽을 연상시키는 은은한 파스텔컬러의 저택들이 바로 그것인데, 이후 러시아를 물들인 소비에트 시절의 건축물과 오묘하게 대조를 이뤄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분명 유럽의 거리를 걷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레닌의 동상이나 반듯하게 구획된 다세대주택 건물이 서 있다거나 하는 식이다. 데카브리스트들의 흔적은 볼콘스키 박물관(Volkonsky House Museum)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옅은 하늘색의 2층 건물은 데카브리스트의 난에서 주동자로 꼽히고, 톨스토이의 친척으로 소설 <전쟁과 평화> 주인공의 모델이 되기도 한 세르게이 볼콘스키 왕자(Sergei Volkonsky)의 저택인데, 현재는 박물관으로 개조해 당시 그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됐다.
볼콘스키 박물관을 둘러보며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은 현지에선 데카브리스트의 부인들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척박한 얼음의 땅으로 남편을 따라온 그들은 이르쿠츠크를 ‘시베리아의 파리’로 변모시킨 숨은 조력자다. 그들은 옷을 짓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밭을 일구고, 아이들을 키워냈다. 물론 다 같이 모여 음악을 연주하고 글을 쓰는 일도 잊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 이 ‘혁명가의 부인’들은 이후 소비에트의 정신을 상징하는 강인한 여성상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볼콘스키 박물관 앞에 조성된 공원에는 볼콘스키의 동상이 아니라 볼콘스키의 부인 마리야 볼콘스카야(Mariya Volkonskaya)의 동상만 굳건히 서 있다. 그 자태를 보면 아마 시베리아보다 더 혹독한 곳이었다고 해도 그녀들은 그곳을 ‘파리’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생명을 품은 바이칼호
많은 이가 이르쿠츠크를 찾는 목적 중 하나는 바로 바이칼호(Lake Baikal)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깊은 호수이자 ‘세계의 민물 창고’인 바이칼호는 이르쿠츠크와 약 60여km 떨어져 있다. 바이칼호를 보러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호수 내에 위치한 올혼(Olkhon)섬에서 며칠을 묵거나, 바이칼호 초입의 도시 리스트뱐카(Listvyanka)에 가는 것. 올혼섬의 경우 차로 6시간여를 달려가야 하므로 당일치기로 관광이 가능한 리스트뱐카를 택했다. 대부분의 여행자는 이르쿠츠크 중앙 시장에서 왕복 300루블(한화 약 5,500원)의 요금을 내고 미니버스를 이용해 리스트뱐카로 간다. 도로 상태가 그리 좋진 않지만 가는 내내 펼쳐진 자작나무 숲이 “지금 당신은 러시아의 대자연을 경험하러 가는 길입니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덕분에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격한 흔들림을 견딜 수 있었다. 긴 자작나무 숲의 행렬이 끝나자 모두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차창 밖엔 짙푸른 색의 바이칼호가 넘실거렸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해가 지면 아직 두꺼운 겉옷을 챙겨 입어야 하는 기온임에도 사람들은 호수 앞에 자유롭게 둘러앉아 챙겨 온 음식을 먹거나 심지어 수영하며 ‘지구의 푸른 눈’을 만끽하고 있었다. 바이칼은 부랴트어로 ‘큰 물’을 뜻한다. 바이칼호는 호수라기보다 차라리 바다에 가까웠다. 이곳에선 꼭 먹어봐야 할 명물이 있다. 바로 바이칼호에만 서식한다는 생선 ‘오물(Omul)’이다. 이름만 들었을 때 자연스레 연상되는 그림이 있어 잠시 망설였지만, 호수 근처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나오는 바이칼 마켓에서 직접 생선을 골라 2층 식당으로 올라갔다. 꼭 우리나라의 수산 시장 식당과 같은 시스템이다. 훈제된 오물을 고를 수도 있고, 식당에서 버터와 크림 등으로 따로 요리한 메뉴를 먹을 수도 있다. 짭짤한 생선 살을 바르며 생각에 잠긴다. 이 거대한 호수는 대체 언제부터 사람들을 먹이고 또 품어왔을까.
무서울 정도로 깊고 넓은 이 호수는 그 자체로 삶이고 생명이며 터전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삶은 이어진다
바이칼호는 336개의 물길을 받아들이는 곳이다. 그런데 물길이 빠져나가는 곳은 안가라(Angara)강 딱 하나뿐이다. 이르쿠츠크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안가라강은 그래서 물살이 강하고 거세다. 겨울이면 영하 30도를 가볍게 넘는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차게 흐른다. 이 안가라강 근처에는 이르쿠츠크의 명소들이 줄지어 있다. 알록달록한 색채로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카잔 성당(Kazan Cathedral)도 그중 하나다. 카잔 성당은 이르쿠츠크에서 가장 큰 러시아 동방정교회 성당으로 마치 ‘인형의 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온통 금빛으로 장식한 내부는 그 화려함과는 정반대로 정적만 감돌았다. 신자들은 숨죽인 채 성물에 입을 맞추고, 기도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신성한 분위기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그들이 하는 모습을 바라봤다. 순간 이르쿠츠크 사람들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믿고 의지할 신이 있어서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경건한 신앙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세속으로 향했다. 러시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레닌 대로’와 ‘칼 마르크스 대로’를 따라가면 대학교와 공공 기관, 공연장 등 이르쿠츠크의 주요 건물을 만날 수 있다. 정말로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광명에서 시작해 이곳까지 올 수 있게 된다면, 레닌 대로-태평로 같은 노선이 실현될 수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봤다. 꿈꾸던 일들이 하나둘 실현되는 요즘이니 이런 상상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닐 게다.
이르쿠츠크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은 어딜까, 고민하다 발길을 돌린 곳은 중앙 시장이다. 연신 담배를 피워대는 노점상들 뒤로 체육관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건물이 보인다면, 그곳이 바로 중앙 시장이다. 해가 뜨지 않아 추운 날이었지만 시장 건물 안은 후끈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열기일 터. 이들이 혹독한 얼음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추위를 이기는 이 열기 덕분이리라.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한 이르쿠츠크 주청사 앞 공원을 지나가며 택시기사 드미트리가 무어라 말을 걸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베스나(весна́, 봄)’ 하나뿐이었지만, 그가 하려는 말이 뭐였는지는 알 것 같아 그저 씩 웃어 보였다. 길고 어두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르쿠츠크에도 봄이 오고 있었다.

[VOL.84] 2019년 5월호 사이트맵 x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움직임, 신북방경제협력
- WTO 개혁 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
- 번영의 길을 함께 걷는 길동무
-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이해하는 법
- "통상 전문 인력을 키우고 순환하는 생태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
- 앞선 경영 마인드로 현지와 상생하는 선진 필리핀
- 동식물 위생(SPS) 조치의 딜레마
- 신남방정책의 현장에서 다리를 잇다!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 한류의 또 다른 이름, K-Literature
- 시베리아에도 꽃은 피었습니다
- 바닷길 향한 마애불, 상인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다
- 유라시아 대륙이 부상하다,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 무역, 통상 분야의 5~6월 일정을 소개합니다.
- 수교 70주년 맞아 교류 확대를 위한 한·필리핀 무역투자 설명회
- 2019년 5월 무역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