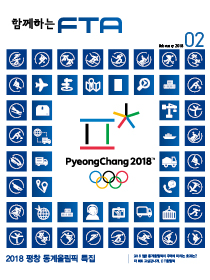PC/Tablet용 헤더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나는 지금 여기
치앙마이 ‘아재로드’
태국 제2의 도시로 불리는 치앙마이는 태국 문화의 원류로 손꼽히는 지역으로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저렴한 물가에 훌륭한 자연경관까지 품어 전 세계 여행객이 찾는 최고의 관광지다.
그러니까 치앙마이로 떠나라? 아니. 그렇게 한 번 왔다 가는 관광지로 끝내기엔 치앙마이는 너무 아까운 도시다.
글 김기석 brunch.co.kr/@kisukkim
태국 경제 개관 (2018년 기준, IMF)
•인구 약 6,918만 명
•GDP 5,050억 달러
•1인당 GDP 7,274달러
•GDP 성장률 4.1%
•교역 4,950억 달러 (수출 : 2,501억 달러, 수입 : 2,449억 달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아재’라고 불리는 나이. 무엇을 봐도 설레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재미가 없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무작정 떠나기로 결심했다. 젊음의 도시, 치앙마이로. 참 오랜만의 선택이다. 어느 날부터 선택지가 줄어든 삶, 이미 다 결정되어버린 ‘아재’의 삶에서 벗어나 꿈을 가득 안고 여행을 떠났다.
젊음이 진수성찬이 되는 곳,
치앙마이 대학교
모든 관광지가 다 그렇듯 치앙마이도 유명한 맛집이 한 집 걸러 하나씩 있다. 그런 맛집을 뒤로하고 치앙마이 대학교의 학생 식당으로 향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치앙마이 대학생은 교복을 입는다. 관광지를 돌아다니다 만나는 태국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교복은 대학생, 지식인, 중산층 이상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돌아가고 싶은 나의 20대로 보일 뿐이다. 학생 식당으로 들어가니 학생들이 나를 힐끔거리며 쳐다봤다. 반대로 나는 그들이 먹는 모습을 힐끔힐끔 쳐다봤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먹느냐고 물으니 “아이 캔 낫 스피크 잉글리시” 하며 자기들끼리 깔깔 웃었다. 맛있냐고 묻자 “예스, 예스” 하며 또 웃음을 지었다. 같은 동양인인데도 외국인이 말을 건넨 것이 신기해서 웃는지, 그저 내 모습이 재밌어서 웃는지 알 수 없지만 말만 건네면 까르르 웃는다.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다. 25 바트(약 960 원)의 쇠고기 국수를 먹는 내내 이곳저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런 곳이 진짜 맛집이 아닐까? 함께 도란도란 웃으며 한 끼 배부르게 먹는 곳. 내게 치앙마이의 맛집을 추천하라고 하면 단연코 치앙마이 대학교 학생 식당을 꼽겠다.
요가원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다
치앙마이의 재미 중 하나는 골목 곳곳에 숨어 있는 요가원을 찾아다니는 일이다. 남자로 태어나 여러 지역을 유랑하며 도장 깨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요가원을 찾아다니는 일도 꽤 재밌었다. 배가 나와 몸이 잘 접히지 않고 손끝과 발끝이 너무 먼 내게는 그 공간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도장 깨기 이상의 용기가 필요했다. 한국의 요가원에는 왠지 날씬한 사람만 가득할 것 같지만, 세계인이 모이는 이곳 치앙마이의 요가원은 다르다. 저마다의 복장과 저마다의 몸매와 저마다의 땀 냄새.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 요가 매트 위에 펼쳐졌다. 마치 요가원의 매트가 해적선에나 있을 법한 보물 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가를 시작하기 전, 선생님이 간단한 설명을 했다. 요가의 시작과 끝은 호흡이라고, 그 호흡은 자신을 만나러 가는 통로라고 말했다. 문득 내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나를 만나면 뭐가 달라질까?
뭐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걸까?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동료, 누군가의 친구,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연봉이 얼마인 사람…. 잠시 홀로, 자세를 멈추고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봤다. 각자의 매트 위에서 각자의 호흡으로 자신을 만나러 가는 듯한 그들의 모습을 보니 드디어 내가 보였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 그냥 나 자체가. 마침내 내가 찾던 나를 이곳에서 만났다.
싫다고 피하면 만날 수 없는 것의 가치
치앙마이에는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가 있다. 수채화, 요리, 판화, 도자기 등 관광지 체험 이상의 클래스가 존재한다. 나는 수채화 클래스를 선택했다. 낙서하듯 종종 그림을 그렸지만 수채화는 언제나 어렵게 느껴졌다. 선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물과 색을 제어해야 하는 피곤함이 싫었다. 왠지 어쩌다 섞여 나오는 것 같은 결과물이 싫고, 덧칠하는 그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채화 클래스에 나를 던져봤다. 수채화를 해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을 해보고 싶었다. 기계처럼 뭐든지 정확하게 해야 하고, 싫어하는 것은 피해버리는 내 삶에서 벗어나 물에 물 탄 듯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었다. 하얀 도화지에 물을 바르고 그 위에 색을 올리면 물을 따라 색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색을 올리자 색과 색이 만나 또 다른 색으로 번졌다. 그 광경에 갑자기 심장박동이 빨라졌다. 마치 방황도 반항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내 어린 시절을 만난 것 같아서다. 어느 것도 정해지지 않은 그 물과 색의 만남이 그 시절 나와 참 닮았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나는 얇은 펜 하나 들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디테일에 목숨 걸며 ‘아재’가 되었을지 모른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월급쟁이의 나를 만나, 물과 색을 품은 붓 한 자루 손에 꼭 쥐어주며 한마디 하고 싶다.
“괜찮아. 용 쓰지 마.
그게 잘 사는 거야.”
새로운 생각이 맺히는 만남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치앙마이에서는 언어 교류 모임이 열린다. 여러 국적의 꽤 많은 사람이 모인다. 다양한 관광객과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과는 다른 이색적인 풍경이다. 생각의 결이 다른 문화가 한데 섞인 세상을 만나는 자리. 그들과 이야기를 하며 나의 생각은 모두 고정관념이었음을 느꼈다.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 정말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에게 나의 최대 고민을 물어봤다.
“너는 나이 듦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누군가는 나이에 따라 다른 재미가 있다고 하고, 누군가는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 것이라 했다. 또 누군가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했다. 가장 재밌는 대답은 ‘늙어가는 것은 한계를 느끼는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래서 자신은 언제나 한계와 싸우는 중이라고. 사람들에게서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더 이상 나이에 주눅 들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삶을 온전히 즐기고 있다. 한 달 남짓 치앙마이의 시간 속에서 얻은 깨달음. 나이는 비록 청춘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아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치앙마이는 이런 곳이다. 내가 만나고 싶은 내가 있는 곳.

[VOL.90] 2019년 11월호 사이트맵 x
- 지난 30년을 넘어 새로운 30년의 미래 비전 제시
-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도약을 위한 과제 제2, 3의 베트남이 나와야
- 날개 단 한·아세안 경제협력 ‘함께하는 미래’ 새 판 짠다
- 날개 단 한·아세안 경제협력 ‘함께하는 미래’ 새 판 짠다
- 제조업 강국 독일과 협력으로 돌파구 찾는 소재·부품·장비
- 모두가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가는 공기기술 전문 기업
- WTO 보조금-상계관세 협정
- FTA 피해 기업 재기 돕는 무역조정지원사업
- 제조업 강국 독일과 협력으로 돌파구 찾는 소재·부품·장비
- 세계가 곧 나의 무대, K뮤지컬의 재탄생
- 나는 지금 여기 치앙마이 ‘아재로드’
- 나는 지금 여기 치앙마이 ‘아재로드’
- 만남은 적었으나 오랜 세월 쌓아온 관계
-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 2019년 11월~12월 일정
- 제조업 강국 독일과 협력으로 돌파구 찾는 소재·부품·장비
- 2019년 11월 무역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