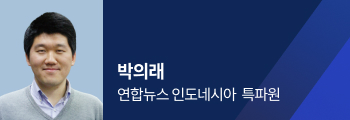전 세계가 ‘넥스트 차이나’를 찾는 가운데 많은 이가 인도네시아를 유력 후보지로 꼽는다. 인도네시아는 석탄, 철강, 니켈, 구리 등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고, 2022년 이후 3년 연속 연 5%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2억8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에 30세가 안된 중위 연령은 성장 잠재력을 가늠하게 한다. 인구 3분의 2 이상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디지털 문해력도 높고, 월평균 급여는 200달러 수준으로 인건비도 저렴하다. 그야말로 자원과 노동력, 내수 시장까지 풍부한 나라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도 투자자에겐 매력적이다. 인도네시아는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리에겐 다소 낯선 나라지만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상이 자리 잡아 어느 나라보다 크고 다양한 한상 기업이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자원 개발부터 의류·신발 같은 노동집약적산업은 물론 최근에는 소비재·유통이나 기술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자원 개발에서 시작된 인도네시아 한상 진출
인도네시아는 산림 면적 세계 8위에 최대 팜유 생산국이며 원유와 가스도 생산한다. 매장량으로 니켈과 주석은 세계 1위, 석탄 6위, 코발트 3위, 보크 사이트 6위, 구리 10위에 이를 만큼 다양한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원자재 부국이다.
한국 기업가가 처음 인도네시아를 찾은 것도 이런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였다. 한국남방개발(코데코)은 1968년 2월 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300만달러 규모의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인도 네시아 칼리만탄에 진출했다. 한국 최초의 해외투자였고, 인도네시아로서도 처음 받아들인 외국인 투자 기업이었다. 코데코는 이후 원목에서 석유와 가스로 사업을 확장했고, 1981년에는 서부 마두라 유전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한국 최초의 해외 원유 개발 사업에도 나섰다. 코린도는 가장 널리 알려진 인도네시아 한상 기업이다. 동화그룹은 1969년 인니동화를 세우고, 동부 칼리만탄주에 산림개발을 허가를 얻었다. 1976년 ‘코리아’와 ‘인도네시아’를 합친 코린도로 사명을 바꿨고, 인도네시아 산림 정책에 발맞추며 목재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지금은 목재뿐 아니라 팜오일, 중공업, 제지, 물류, 부동산, 무역, 금융 등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며 직원 약 2만3000명, 연 매출 12억달러의 인도네시아 대기업이 됐다. 2021년 코린도그룹에서 분사한 TSE그룹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 크다.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에 올라탄 신발·봉제 산업
3억 명에 근접하면서 젊고 값싼 노동력은 또 다른 매력이다. 한상은 이를 노리고 일찍이 신발이나 봉제, 가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산업을 펼쳐왔고, 지금도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신발, 섬유·봉제 산업은 가파른 임금 상승에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고, 동시에 해외로 대거 생산 기지를 이전했다. 그중 한 곳이 인도네시아였다. 코린도가 처음 한국계 신발 제조 업체를 만들었고 이어 태광실업이나 금광제화, 세화, 화승, 한성기업 같은 주요 신발 제조사도 잇달아 현지에 진출했다.
여기에 프라타마나 KMK처럼 현지에 기반을 둔 한국 기업이 탄생했다. 이들은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파트너로 성장했고, 지금도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신발 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재인도네시아한국신발 산업협의회(KOF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0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지인 근로자 25만여 명을 고용해 연간 1억3200만 켤레를 생산, 총 35억달러 매출을 올리고 있다. 섬유· 봉제도 비슷하다.
재인도네시아한국봉제협의회(KOG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86개 회원사가 있으며 이들의 현지인 고용 규모는 60만 명에 달한다. 인도네시아 전체 섬유·봉제 산업 근로자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다. 단순 저임금으로만 승부를 내는 것은 아니다. 섬유 업체 이노사이클은 버려진 페트병을 가공해 섬유 제품을 만들고 있다. 친환경 재생 기술 기업으로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한류 타고 커지는 내수 시장…리스크도 있어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데다 소비 성향이 높은 젊은이가 많고 특히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물건에 대한 구매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기업이 무궁화 유통이다. 무궁화 유통은 1980년대 초 한국 식품을 유통하는 작은 상점에서 시작해 40년 넘게 사업을 키우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한국 식품은 물론 가정용품과 의류, 화장품 등 한국 소비재를 판매하며 중견 유통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밖에도 진영은 천연 조미료로 식품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고, 바람소주는 한국식 희석 소주를 생산해 현지 젊은층에 한국 소주를 전파하고 있다.
큐레이브(레스토랑 소개), 캐시트리(모바일 광고 플랫폼), OK홈(청소 서비스) 등 한국계 스타트업도 인도네시아에서 꿈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은 규제 불확실성과 부정부패, 인건비 상승, 금융 불안 등 복합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2023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인도네시아는 180개국 중 115위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6.5% 올랐다. 여기에 2024년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정책 리스크도 있다. 전국 약 9000만 명의 아동과 임산부 등에게 하루 한 끼를 제공하는 무상급식 정책 등 각종 복지 정책은 재정 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고, 이로 인해 루피아화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