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자동차산업의 성장 발목을 잡은 적기(赤旗)조례
산업혁명의 나라 영국에선 1820∼1840년 증기자동차 황금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영국의 증기자동차산업은 실패의 길을 걸었다. 기존 마차·철도 업체의 거센 반발에 영국 정부가 1865년 도심 차량 최고속도를 3.2km/h로 제한하는 ‘적기조례법’을 시행한 탓이다. 당시 증기차는 이미 시속 30km를 넘나들던 시대였으나 차보다 앞서 붉은 깃발·등을 단 마차가 달리면서 다른 마차와 말 등이 놀라지 않게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이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원인이 되었다.
글 김동욱 한국경제신문 중기과학부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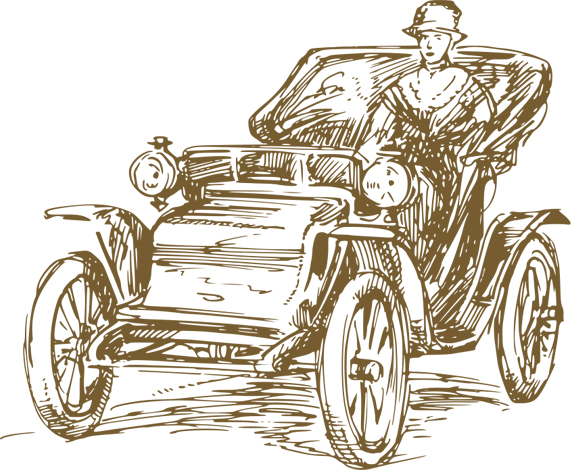
산업혁명을 주도했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영국이 어떤 이유로 쇠퇴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질문은 오랜 기간 경제사학계에서 열띤 논쟁이 오갔던 핵심 주제였다. 영국의 전성기로 평가되는 빅토리아 시대 후기는 사회 모순이 응축된 ‘경제 쇠퇴의 씨앗’이 뿌려진 시기로 특히 주목받았다.
영국 사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끈 것은 산업 자본가들이었지만 빅토리아 시기까지 사회의 주도권은 여전히 전통적 지배계급이 쥐고 있었다. 신사층(gentry)으로 대표되는 영국의 지배계급은 토지 귀족의 농업적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기업인으로 표방되는 부르주아의 가치에 비판적이었다. 그리고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옥스브리지’)로 대표되는 고등교육 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반(反) 산업·기업 정서가 확대 재생산됐다.
반(反)산업 정신은 사회 곳곳에 깊숙하게 침투했다. 도시 생활과 자본주의, 산업주의는 혐오의 대상이 됐다. 산업사회는 ‘어둡고 악마소굴 같은 공장’이라는 대표 이미지로 낙인이 찍혔다. 반면 ‘잉글랜드 정원’으로 표현되는 전원적 상징은 긍정적인 가치로 부상했다.


19세기 영국의 산업가들은 신사층의 주장에 동화됐고, 산업자본 대신 전통 젠트리의 영역이던 지대소득을 추구하거나 금융 분야로 앞다퉈 진출했다. ‘산업자본가의 지주화(The gentrification of the Industrialist)’가 촉진됐다. 그리고 그 결과 제조업 활동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업가들의 발목을 잡는, 전근대적인 규제들은 빠르게 마수를 뻗쳐갔다. 사회는 혁신과 발전보다는 기득권과의 타협을 택했다.
증기자동차가 선보이면서 마차업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1865년 제정된 소위 ‘적기조례(赤旗條例·Red Flag Act)’가 대표적이다. 정식 명칭이 ‘고속도로에서의 동력기관에 관한 법(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인 이 법은 도로의 손상을 막고, 주변의 말을 놀라게 하지 않으며, 좁은 도로를 자동차가 가로막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실상은 기존 마차 사업을 보호하고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자동차가 운행하려면 반드시 운전사와 기관원, 기수 등 3명이 있어야 했다.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6.4km, 시가지에선 시속 3.2km로 제한했다. 차량은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증기를 배출하는 것도 금지됐다. 무엇보다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을 들고, 밤에는 붉은 등을 손에 쥐고 자동차 60야드(약 55m) 앞에서 차를 선도하도록 했다. 붉은 깃발을 앞세워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게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882년에는 영국 정부가 “전력은 공공재이고 전기가 화재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기조명법(Electric Lighting Act)’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민간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뒤 21년이 지나면 전력 생산권을 공공회사에 양도하도록 강제했다.
‘적기조례’와 ‘전기조명법’처럼 자국 산업의 손발을 묶는 황당한 규제들이 잇따라 도입되면서 안 그래도 기업가 정신을 상실한 영국의 산업은 쇠퇴가 가속됐다.
이처럼 영국 기업들이 발이 묶인 사이 자동차와 전력산업 등 2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독일과 미국으로 넘어갔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영광은 그렇게 야금야금 그 기반을 상실해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