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세계적인 핵심 광물 부국이다. 1906년 서호주 그린버시스 광산에서 리튬이 최초로 발견된 이후 1983년 본격적인 리튬 광산 운영을 시작했다. 1954년에는 캘럼버 지역에서 우라늄 탐사 과정 중 니켈 광산이 발견됐으며, 1967년 캘럼버 니켈 광산이 정식 개장하면서 호주는 주요 광물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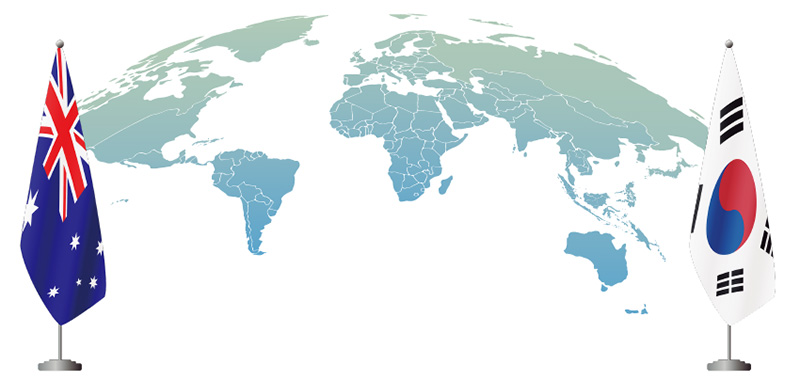
호주, 리튬·니켈 등 주요 광물 생산국으로 자리 공고화
호주 지질과학청에 따르면, 2024년 호주의 리튬 매장량 세계 2위, 니켈 2위, 코발트 2위, 희토류 4위를 점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호주가 ‘전통적인 자원 강국’에서 나아가 첨단산업 시대의 ‘핵심 광물 강국’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자원 강국인 호주는 안정적인 제도와 체계적인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핵심 광물에서도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BHP그룹, 리오 틴토(Rio Tinto) 등 글로벌 기업이 호주에 진출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다. 배터리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필수적인 광물이 집중된 호주는 향후 국제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호주와 핵심 광물 협력은 우리나라의 미래 첨단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호주는 2023년 ‘2023~2030 핵심광물 전략’을 발표했다. 단순한 자원 수출국에서 벗어나 자국 내 정제 및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제조업으로 가치 사슬을 확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자원 수출을 넘어 자국 내 첨단 가공 산업을 육성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2024년 5월에는 ‘호주에서 만드는 미래(A Future made in Australia)’ 정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227억호주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가공 및 첨단 제조업 육성 계획을 제시하고, 핵심 광물 가공과 제조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지난 4월, 호주 정부는 새로운 ‘핵심 광물 전략 비축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관세 부과로 고조된 무역 긴장 속에서 자국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여기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첨단산업 필수 자원이 포함된다. △국가 오프테이크1) 계약(정부가 민간 프로젝트와 계약해 일정량 광물을 우선 확보하거나 특정 가격에 구매할 권리를 확보) △선별적 비축(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자원을 정부가 직접 비축)이 핵심이다. 2026년 하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며, 초기 투자 규모는 12억호주달러다. 이는 핵심 광물 시설에 10억호주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펀드 총규모는 50억호주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70억호주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생산 세금 공제 제도(CMPTI)’와 연계돼 민간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한·호주 핵심 광물 협력 강화
이 같은 정책 흐름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 2월 호주 의회는 2040년까지 핵심 광물 정제 및 가공 비중 10%가량 한국을 비롯한 70여 호주 무역 파트너국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연방 하원의 핵심 광물 상임위원회가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호주가 생산하는 핵심 광물은 주로 동북아를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국제 협력에서 주요 파트너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호주는 해당 사안 관련 국제 협력에도 적극적이다. 호주는 2022년 미국이 주도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2)에 참여했다. MSP는 2022년 미국 주도로 출범했는데,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 불안 증대가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이후 국가 간 무역이 위축되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면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구조가 큰 위험 요인으로 부상했다. 전 세계 배터리용 리튬·니켈·코발트의 상당한 양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은 ‘안정적이고 투명한 공급망’을 공동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따라 MSP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파트너국이 참여해 핵심 광물 탐사, 채굴, 가공, 재활용,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국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MSP는 단순히 광물 거래를 넘어서 △ 투자 촉진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 준수 △ 공급망 다변화 △개도국 프로젝트 공동 투자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호주는 MSP 내에서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는 공급국으로, 한국은 정제 및 제조 역량을 갖춘 파트너국으로서 역할을 분담하며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호주는 이어 2023년 12월 일본에서 열린 MSP 총회에서 공식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4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는 한국, 일본, 인도와 함께 ‘퀀텀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다. 단순한 광물자원 확보 차원을 넘어, 차세대 첨단산업 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망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퀀텀 첨단산업공급망 협력의 핵심은 네 나라가 리튬, 니켈, 희토류 등 광물자원 공급을 안정화할 뿐만 아니라, 가공·정제, 첨단 제조, 나아가 양자 컴퓨터와 반도체, AI 산업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가치 사슬을 공동으로 구축한다는 데 있다.
한·호주 광물 협력, 민관 아우른 다각도 협력 추진
호주의 핵심 광물 정책의 무게중심은 정제·가공 산업 육성과 국제 파트너십 강화에 있다. 호주와 우리나라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협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첫째, 정부·공공 차원의 협력이다. 양국 정상은 에너지·광물 협력 강화를 합의했으며, 한국 핵심 광물 투자위원회는 호주와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는 호주무역투자대표부(Austrade)와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둘째, 민간투자 확대다. 호주 국영 기관은 한국 기업과 공동으로 핵심 광물 개발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호주 기업은 한국 내 희토류 합금 공장과 수산화리튬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다자 협력이다. 한국은 MSP 의장국으로서 핵심 광물 공동 금융 조달을 주도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호주 광물 협력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다. 배터리, 반도체, AI,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에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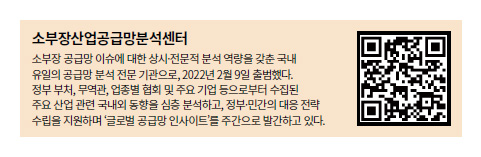
용어설명
- 1오프테이크(Off-take)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정해진 조건(가격, 수량, 기간 등)에 따라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 2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2022년 미국이 주도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Mineral Security Partnership)을 의미한다. 출범식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독일,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유럽연합(EU) 등 11개국이 참여했다. 출범 당시 파트너십 참여국들은 “핵심 광물이 세계경제의 발전과 청정에너지로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