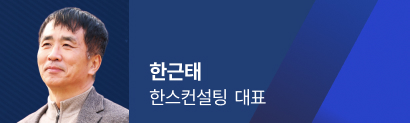책으로 읽는 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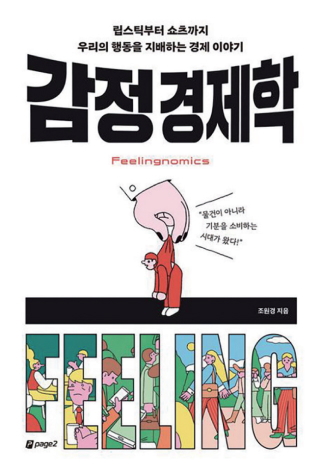
사람은 합리적일까, 비합리적일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결정할까.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행동 경제학인데 감정경제학은 바로 거기에 관한 책이다.
대표적인 것이 포모(Fear of Missing Out) 현상이다. 남들 다 하는데 혼자 소외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행동을 말한다. 영혼까지 팔아 투자하는 영끌, 빚을 내서 하는 빚투기가 포모의 전형적 현상이다. 남들이 주식을 하니까 덩달아 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의 버블은 포모의 결과물이다. 생각의 전염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비슷한 개념의 포보(Fear of Better Option)도 있다.
더 좋은 옵션이 있을 거 같아 결정을 못 하고 미루는 현상이다. 더 좋은 배우자를 찾다 때를 놓친 싱글을 연상하면 된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게 포모이고,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을 거 같아 결정을 미루는 것이 포보인데 둘이 결합하면 분위기 휩쓸려 이상한 곳에 투자해 손해를 보거나 아예 결정을 못 하는 결정 장애가 된다. 그래서 포모에 빠진 사람을 그냥 맹목적으로 무리를 따르는 ‘세렝게티의 영양’으로 비유한다. 근데 그게 현대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도 남해주식회사 주식에 투자해 전 재산을 날렸는데 이후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불황이 오면 립스틱이 많이 팔리는 현상도 사람 심리와 관련이 있다. 대공황 기간 중 다른 물건의 매출은 반으로 줄었지만 화장품 판매량은 증가했다. 9·11 테러 때도 그렇다. 왜 그럴까. 비싼 건 살 수 없지만 적은 부담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물건을 찾았고 그게 립스틱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 에스티 로더의 레너드 로더는 립스팁 지수란 걸 발표했고 그게 불황을 예측하는 지표가 되기도 했다. 자존감의 발로와 얇아진 지갑의 타협 현상이다. 립스틱을 바를 수 없는 남성은 불황 때 무엇을 살까. 적은 돈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일까. 바로 넥타이다. 남성들은 립스틱 대신 넥타이를 바꿔 변화를 준다.
남녀의 결혼이나 데이트에도 경제 개념이 숨어있다. 내가 생각하는 결혼은 경제적 공동체다.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유리하면 결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살게 된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걱정하지만, 그들은 나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스탠퍼드대의 폴 오이어 교수는 ‘짝찾기 경제학’에서 짝 찾는 걸 구인·구직에 비유한다. 100번 중 37번째에 결정하는 게 좋다고 얘기한. 이른바 37%의 법칙이다. 첫 만남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난 후 결정하는 것도 아니란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감한 신호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란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거기에는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대표 사례가 수컷 공작이다. 생존 측면에서 거추장스럽고 사치스러운 꼬리를 달고 다닌다는 건 낭비다. 자칫하면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수 있지만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자신이 능력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인데 실제 이게 작동을 한다. 화려한 꼬리를 가진 수컷에게 암컷이 오는 것이다. 신문에 난 악당이나 범죄자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본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도둑질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현금 수송차에서 돈다발이 쏟아져 길바닥에 뒹굴고 있다면 줍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누구나 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근데 언제 죄를 저지를까. 경제학자 게리 베커는 범죄행위 역시 비용과 편익에 기반을 둔 경제행위의 일종으로 해석한다. 범죄행위를 통해 얻는 유익이 발각될 가능성과 체포 후 예상되는 형량보다 높으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음주 운전을 없애는 방법은. 벌금을 1억 원쯤 부과하면 사라지지 않을까. 요즘 문제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런 경제적 개념을 생각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관련해 하인리히 법칙이란 것이 있다. 보험사에 근무하던 하인리히가 사고를 예방해 보험사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연구하다 발견한 사실인데 한 건의 치명적 사고가 있기 전 중대한 사고가 29건, 아주 사소한 사고가 300건 있다는 것이다.
대형 사고는 자그마한 사고의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사소한 사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비슷한 개념으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엉망이 되지만 그걸 그때그때 고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소한 건 결코 사소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잘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못지않게 실수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쌓은 걸 한 방에 날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 밑바닥에 깔린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책이 거기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